|
|
경자유전 원칙을
다시 생각하다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는 일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성실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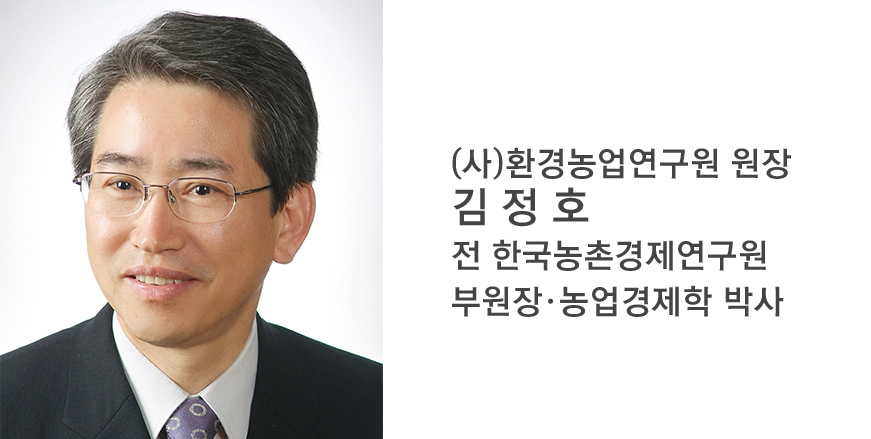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며, 1949년 농지개혁 이후 토지제도의 근간으로 삼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명시되었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경작을 통한 수익이 농민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에서 ‘원칙(原則)’이라고 규정했으니, 하위법령에서는 당연히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 돼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통계청의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지 중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비율은 2015년 기준 56%에 불과하며, 즉 비농업인 소유가 44%인 셈이다. 또한 농가경제조사에 의한 농지임대차 비율은 2017년 기준 51%에 달하고, 임대농지의 43%는 비농업인 소유이다. 통계 수치를 엄밀히 따져보면, 이른바 부재지주로서 농업인에게 농작업을 맡기는 위탁영농이나 통작 영농이 성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농지법에 비농업인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지만, 이농·상속 등 합법적인 소유농지는 사적(私的) 영역에서 임대가 가능하다. 농지를 지켜야 할 농지법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농지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는 농지전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실정이다.
농지법 제정 직전인 1994년에는 7개 법률에서 용인될 정도로 농지전용이 엄격히 관리되었으나, 그 후 2019년까지 농지전용허가 의제 법률은 78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렇게 경자유전 원칙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7년 2월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경자유전 규정의 삭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농촌 현장에서도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 농업인들조차 불편해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농하더라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가산(家産)으로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한데다 농업인의 상속자들은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일부는 농지 소재지와 가까운 중소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인 대우를 받으려는 반도반농(半都半農)들이다.
이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부재지주가 만연하여 경자유전에 실효성이 없다고 헌법 규정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성실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기본 방향은 ‘농지공개념’(農地公槪念)을 도입하여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농지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우량농지 보전제도를 강화,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비,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세제 및 부담금 제도를 개편,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의 확충 등이다.
나아가 경자유전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사업인 농지은행사업을 확충하고 충실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농지은행은 우리나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공적 기구이다. 마침 금년에 발족 30년을 맞는 농지은행이 앞으로도 경자유전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